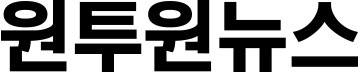미국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한국 경제는 유독 크게 흔들린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까지문제는 품목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다.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되풀이되지만, 결과는 늘 뒤늦은 대응과 불리한 조건의 수용이었다. 국민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해왔기에,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협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비대칭적으로 작동해 왔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예외 조항과 국가안보 논리를 적극 활용해 왔고, 우리는 그때마다 “동맹”이라는 단어 앞에서 협상력을 스스로 낮췄다. 관세는 경제 문제이지만, 협상은 철저히 정치의 영역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말해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관된 자유무역 원칙이 아니라 국내 정치 일정과 산업 로비에 따라 움직여 왔다. 대통령 선거, 중간선거, 러스트벨트 표심, 노조의 압박—이 모든 것이 관세 결정의 배경이 된다. 이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돌발 변수’처럼 대응해 왔다. 협상이 전략이 아니라 사후 수습으로 전락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협상 태도다. 관세 협상은 단순히 “피해를 줄여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다. 공급망, 안보 협력, 기술 이전, 투자 규모 등 교환 가능한 카드들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거래다. 그러나 우리의 협상은 종종 원칙 없는 유화와 과도한 선의에 기대어 왔다. 미국이 요구하면 “한미 관계를 고려해” 양보하고, 결과가 나쁘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설득당한 것에 가깝다.
기업들은 이미 경고해 왔다. 관세 불확실성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과 성장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책 당국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문제없다”, “대체 시장을 찾으라”는 말로 책임을 넘겨왔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관세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섭력의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 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다시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특별히 요청했다.
미국과의 중대한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긴급히 국회를 찾아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재경위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과 만나 대응을 협의했으나 각 당간 의견 차이가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예측 불가 상황 대응에 대한 대책의 미비인가? 우리는 관세 협상을 ‘외교 이벤트’로만 다뤄왔는가, 아니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 왔는가. 만약 후자였다면, 왜 매번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전부터 ‘지킬 선’이 명확하지 않았는가?
동맹은 무조건적인 양보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진 파트너일 때 더 공고해진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충실한 나라다. 그렇다면 한국도 그래야 한다. 관세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친분이 아니라 전략이다.
협상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국민 혈세를 고수준급의 경비를 써 왔다. 그러나 결과는 원점인 셈이다. 국민은 더 이상 “노력했다”는 말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 그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 없이는, 다음 협상에서도 우리는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은 뻔하다. 그리고 그 질문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