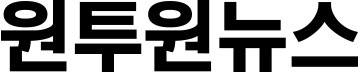국민의힘이 또다시 ‘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피로다. 매번 변화를 말하지만 바뀌는 건 얼굴 몇 명뿐, 그 뒤의 판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보수의 간판을 걸고 집권을 꿈꾸려면, 먼저 기득권 보호막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국민 빼고 다 힘내는 당’이라는 냉소만 키울 뿐이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원칙보다는 반사이익 정치에 기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진보 진영을 반대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민생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청년 일자리, 고령층 복지,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활성화 같은 의제는 선거철에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이후에는 정치 구호 속에서만 명맥을 유지했다. 이쯤 되면 보수의 무게감이 아니라 무기력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면면은 혁신의 기수라기보다 자리싸움의 베테랑처럼 보인다.
경륜을 내세운 후보는 과거의 정치 방식을 현재에 이식하려 하고, 청년을 내세운 후보는 겉만 젊을 뿐 속은 기성 정치의 복사판이다. 통합을 외치는 후보는 정작 자기 진영만의 통합을 꾀한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계파 결속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이 바라는 당 대표는 달변가나 이미지 메이커가 아니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부수고 국민 앞에 설 사람이다. 계파의 이해보다 국민의 고충을 먼저 보고, 여론조사보다 시장 상인의 표정을 먼저 읽는 리더다. 그러나 지금의 후보 경쟁은 “누가 더 바꾸느냐”의 경연장이 아니라 “누가 더 버티느냐”의 생존 게임에 가깝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당 대표 후보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말하려면 기득권 안에서 안전하게 놀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갈아엎을 의지와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기로에 서 있다. 또다시 ‘간판만 새로 칠하는 개편 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을 송두리째 뒤집는 대수술에 나설 것인지. 선택은 지도부와 후보들의 몫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분명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과는 국민의 표로 냉정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 표가 심판이 될지, 지지가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