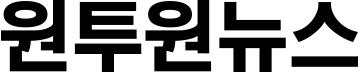흑백 논리와 변곡으로 다사다난 했던 2025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2025년의 끝에서 국정을 돌아보는 질문은 더 이상 수사적일 수 없다. 지난 1년간 국가 운영의 중심이 과연 국민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권력 스스로를 향해 기울어 있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다. 성과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문제는 방향이고, 태도이며, 책임이다.
올해 국정은 유난히 ‘속도’를 앞세웠다. 그러나 속도는 곧바로 졸속으로 이어졌고, 졸속은 설명 부재와 책임 회피를 낳았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정책 결정은 반복됐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돌아온 답은 “불가피했다”는 말뿐이었다. 국정 운영이 사후 해명에 의존하는 순간, 민주적 통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입법 강행과 속도전은 이제 관행을 넘어 고질이 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처리 과정에서 숙의와 조정은 형식으로 전락했고, 소수 의견은 걸림돌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에서 성립한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법률로 포장된 권력 행사에 불과하다.
리더십의 문제는 더 뚜렷하다. 강한 리더십과 거친 통치는 다르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권력은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도전으로 오해한다. 그 결과 국정의 언어는 날카로워졌고, 사회의 피로는 누적됐다. 리더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조직은 위축되고 국민은 멀어진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과의 거리다.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인 결정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국정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설명은 항상 뒤따랐고, 책임은 늘 흐릿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다. 그럼에도 올해 국정 곳곳에서는 통보하는 권력의 태도가 반복됐다.
연말은 면피의 시간이 아니다. 결산은 변명보다 성찰을 요구한다. 국정이 국민을 향하지 않을 때, 국가는 흔들리고 신뢰는 빠르게 소진된다. 신뢰를 잃은 국정은 어떤 정책 성과로도 설득될 수 없다.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국정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움직였는가다. 국민을 향하지 않은 국정은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이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내년이 또 다른 실망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정의 방향은 분명히 바로잡혀야 한다.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1 직장여성이여, 다이어트 포기하지 마라
- 2 KGFC 국제기금, 대선 공약실천 소요비용, 국민공감대 형성되면 지원 용의.
- 3 몽골 경제교역사절단 한국 방문, 국내 기업 몽골 진출 쾌거
- 4 미국연합상회(나스닥SPAC) 박찬윤총재, 한국지부 대표로 임명 됐다
- 5 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6 3분기 월평균 알바소득 ‘67만 8465원’… 평균시급 ‘7,060원’
- 7 가우넷, 디붐 블루투스스피커 ‘오라벌브’ 스마트 LED조명스피커 출시
- 8 <남북문제 특별진단>朴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北 정권 자멸의 길”
- 9 상상후, ‘프로듀사’에 이어 ‘그녀는 예뻤다’에도 인테리어 소품 지원
- 10 KUFFA, 14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2015 KUFFA 협회장배 플래그풋볼 대회’ 개최
- 사설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정은 국민을 향했는가
- 정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적십자 회비 모금행사 동참
- 경제고성군, 내년 예산 4,315억 원 확정
- 사회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 교육남해대학, RISE·글로컬대학사업 성과 확산 위한 방산·항공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 문화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세계관세청-이집트 관세당국, 특송물류시스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IT/과학과기정통부,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까지 뒷받침한다!
- 포토뉴스한국 정상 첫 안보리 회의 주재…"AI,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
- 스포츠고성군, 어르신 스포츠강좌 공모사업 선정
- 건강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병원 간병현장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직접 살펴
- 컬럼/시론긴급발표·폭탄선언 남용, 이제 국민은 놀라지 않는다.
- 서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숙박 예약,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 부산공공기관 젊은 리더들 부산의 미래를 이끈다… '부산시-공공기관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
- 경남경남도, 노동 현안 특별간담회서 상생협력 모색
- 인천숭의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의 성장을 도우는 어린이재능발견교실 유아발레 발표회 진행
- 경기이천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 공사 착공식 개최
- 대전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 세종세종시교육청,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유치원 교원 및 보육 교직원 연수
- 충남충남도, 라오스 지방정부와 스마트 농업 협력 논의
- 충북충북도,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대구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한에스토니아대사와 면담
- 경북경상북도, 탄소중립 선도 ‘친환경 미래 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
- 광주광주광역시 소방,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점검
- 전남전남도, 조선·해양산업 미래 혁신·상생 발전 다짐
- 전북전북도,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향해 첫발 내딛다
- 울산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 제주제주도, 내년 도시계획도로 투자 확대…건설경기 회복 도모
- 사설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에게 '새 임기' 부여? 헌법 68조 2항의 정면 위반이다
- 정치3분기 월평균 알바소득 ‘67만 8465원’… 평균시급 ‘7,060원’
- 경제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사회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교육고소영, 피카부 백 판매 수익금 기부
- 문화GTX-B노선 최대 수혜지, 마석역 바로 앞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눈길
- 세계미국연합상회(나스닥SPAC) 박찬윤총재, 한국지부 대표로 임명 됐다
- IT/과학“친환경 신기술 개발부문" 장영실 대상 수상자로 신장균 박사 선정
- 포토뉴스KGFC 국제기금, 대선 공약실천 소요비용, 국민공감대 형성되면 지원 용의.
- 스포츠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지적농구팀에 수준별 맞춤 농구 지도
- 건강벨톤보청기 성남분당지사, ‘보청기 무료체험 이벤트’ 실시
- 컬럼/시론<남북문제 특별진단>朴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北 정권 자멸의 길”
- 서울서울시, '청년' 기업과 손잡고 지역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
- 부산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 경남박완수 경남도지사, 성파 종정예하 전시회 방문
-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생명 존중 안심마을’ 협약식 개최해
- 경기구리시, 롯데마트 조기 개장 위해 사전협의 착수한다
- 대전이장우 시장“대전 균형발전 위해 대덕구 적극 지원할 것”
- 세종세종도시교통공사, 박물관․도서관 버스 운행 개시
- 충남충남도, 청년 농업인과 미래 농업 방향 모색
- 충북충북교육청, 농업계 고등학생들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 우수한 성적 거둬
- 대구대구시 2024 K-MediWellness Festa (케이-메디웰니스 페스타) 개최
- 경북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의성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산불 진화 2만 리터 이상 수송기 적극 도입해야”
- 광주광주광역시교육청, ‘2024 일하는 청소년 공감 토크 콘서트’ 실시
- 전남전남 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전 선전 다짐
- 전북전북자치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는다
- 울산울산시 - 울산국회의원협의회 “2026년도 국비 확보 한 팀으로 전력투구 나선다”
- 제주제주상하수도본부,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