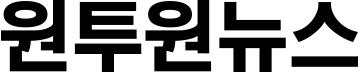북한, 중국,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보여준 결탁이 한국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가 맞닥뜨린 국제정세의 난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4일 북중 정상회담은 장차 한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던져준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열병식 관람 망루에 올라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며 '반서방 연대'의 세를 과시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나라가 뭉친 것으로, 중·러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도 우려를 키웠다. 양국은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빠졌다.
북한이 당시와 달리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중국과 북한이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방중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행은 그간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던 북한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암울했던 비핵화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뒷배로 확보한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가 더 줄었고, 설사 대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군축을 주제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라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터주길 기대하던 한국의 전략도 먹혀들기 쉽지 않은 구도가 된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외교전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참석을 확답하진 않고 있지만, 참석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면서 북한 편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경주 APEC에 참석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또한 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무역 문제 등이 주요 의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반도에서 만나는 만큼 북한 문제 또한 깊이있게 다뤄질 수 있다.
두 정상의 대북 메시지가 일치된 방향으로 나온다면 북한을 대화 무대로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서울=연합뉴스】